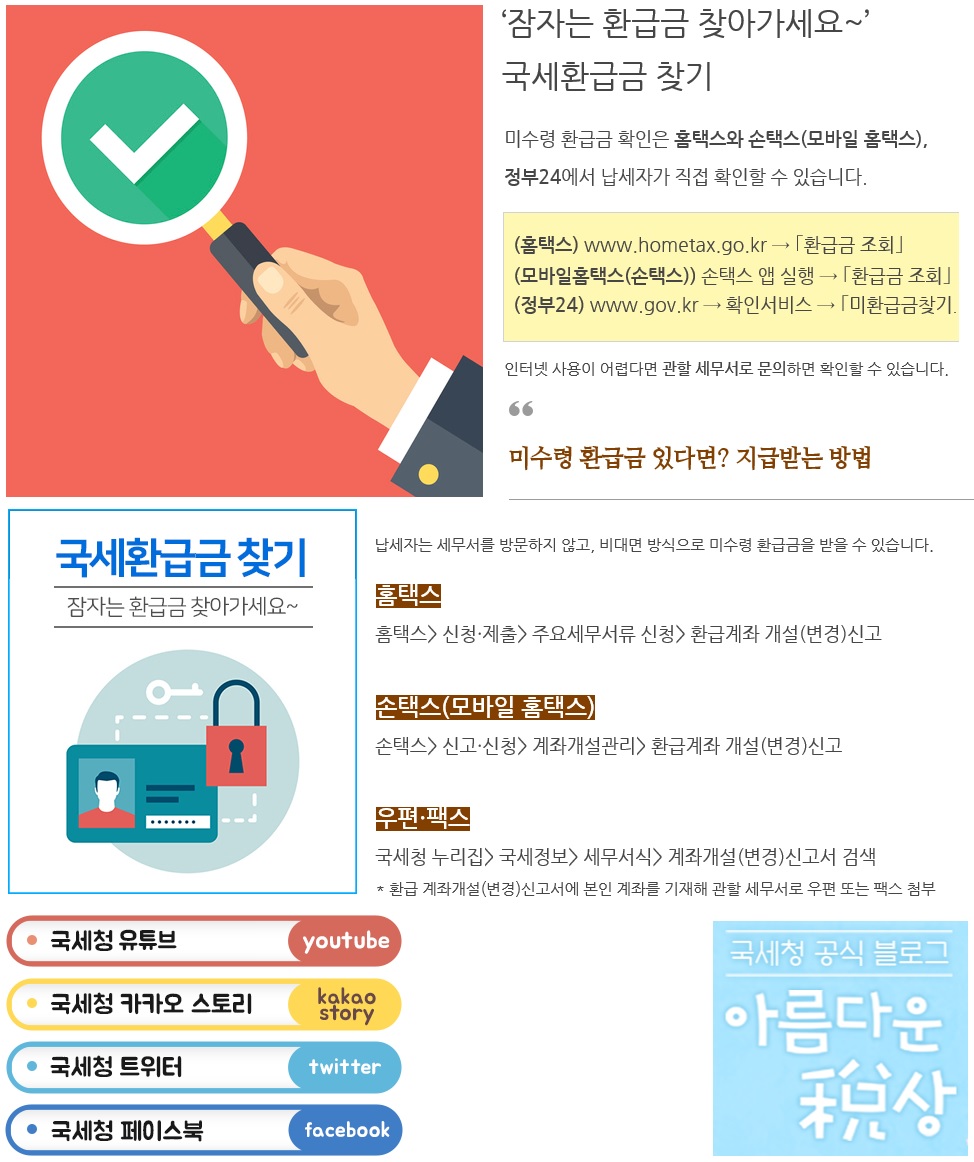안무(按舞, choreography는 그리스어의 choros(춤)와 grapho(쓴다)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춤이나 무용 작품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말한다. 안무는 문학 작품이나 음악을 시각화하여 움직임과 동작으로 설계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안무가는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영화, 패션쇼,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피겨 스케이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미국의 현대 키네틱 아티스트 아서 갠슨(Arthur Ganson)은 뉴햄프셔 대학교(University of New Hampshire)에서 미술을 공부한 후, 1977년 무렵부터 키네틱 조각 작품을 만들어온 작가로서, 단순한 기계운동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특한 예술적 시선으로 ‘기계공학과 안무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있는 작가이다. 아..